노자(미상, 공자시대 전후로 추정)의 '도덕경'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을 쓴 사람이다. 노자가 실존인물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노자의 사상, 또는 그 사상이 담긴 책의 비조는 노담이며 실존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가 실존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쓴 <노자>의 판본도 여러가지이다. 위나라의 왕필이 주석을 단 왕필본, 한나라 은둔 선비였던 하상공이 쓴 하상공본, 당나라 도사였던 부혁이 제작한 부혁본 등이 있다. 1973년에 발굴된 백서본과 특히 1993년 발굴된 초간본은 기존의 <노자> 연구에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차이들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한비자>에는 노자와 <노자>에 관한 글 '해로(解老, 노자를 풀이한 글)'와 '유로(喩老, 노자를 비유한 글)'가 있다. 여기에는 노자가 유가의 사상과 비슷한 면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비가 쓴 것이 아니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물 노자와 책 <노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포스트에서 인용하는 <노자>의 텍스트는 전통적인 주석본에 바탕을 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노자열전(老子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노자는 초(楚)나라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李)씨이고 이름은 이(耳), 자를 담이라 하였다. 주나라(동주) 수장실(도서관)의 관리였다. 공자가 주나라로 찾아가 예(禮)에 대하여 물으니 노자가 이렇게 답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옛날 사람은 이미 그 육신과 뼈가 썩어 없어져 버렸고 오직 말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오. 또 군자라는 사람도 때를 잘 만나면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대밭을 걸어다니게 되오. 나는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덕을 많이 쌓은 군자의 태도도 겉보기에는 어수룩하게 보인가’라고 들었소. 그대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 하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말아야 하며, 쾌락을 멀리 하길 바라오. 그런 것들은 그대에게 무익한 것들이오. 내가 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오.”
공자는 돌아가서 제자에게 노자에 대해 말했다.
“새는 날 수 있고 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달리는 놈은 그물을 쳐서 잡고, 헤엄치는 놈은 낚시로 잡으며 나는 놈을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용은 잡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오늘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 무위자연(無爲自然) : 무위(無爲)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人爲)에 대비되는 말로서 억지로 무엇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연의 도에 따라 스스로 그러함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항구불변한 도가 아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道可道非常道에서 첫번 째의 ‘도(道)’는 명사이고, 두 번째의 ‘도(道)’는 동사이다. 달리 말하면 첫째 ‘道’는 원래의 스스로 그러한 ‘道’를 뜻하고, 두 번째의 ‘道’는 인간의 입으로 일컬어진 도이며 설명할 수 있는 도이며,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진 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구불변(恒久不變)의 도가 아니다.
인위적인 억지에 의해서 자연을 해석할 수 없으며, 자연은 그 자체로서 ‘道’라고 할 수 있다. 항구불변의 道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름을 道라고 붙인 것이다.
‣ 자연천(自然天), 성인불인(聖人不仁)
공맹이 바라보던 하늘은 인간 도덕의 근원으로서 도덕천(道德天. 예를 들면 '誠者 天之道也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이다. 그러나 노자가 바라보는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노자는, 만물은 ‘짚으로 만든 개(芻狗.추구)와 같다고 하였다. 거기에 순수한 선이니 인간 도덕의 근원이니 본성이니 하는 것은 개입될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물은 짚으로 만든 개(萬物爲芻狗)와 같다. 성인도 어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짚으로 만든 개와 같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과 같은 것이어서 내부는 텅 비어 있지만 힘이 다하는 일이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이 더욱 많이 나온다. 한편 말이 많으면 때때로 이치에 궁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간직하여 둠만 같지 못하다.
→ 확실히 유가사상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유가에서 수양은 중요하다. 하늘의 항선(恒善)으로부터 품부받은 성품을 확충하고 예와 덕을 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인-향원-견자-광자-군자-성인의 단계들을 거친다. 성인은 욕망과 도덕을 일치시킨 단계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공자는 이를 두고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하여 마음에 따라 행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도가사상에서 성인은 인위적 예법의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경지이다. 성인은 유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진 사람이 아니다.
‣ 상선약수(上善若水) :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다른 것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 겸허하게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아무도 물을 이길 수가 없다. 자연은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가지고 있다. 사람도 이처럼 겸허와 다툼이 없는 도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투쟁의 역사, 피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 인위적으로 타인을 다스리려고 하고 타국을 조정하고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다.
‣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을 법칙 삼아야(의지해야) 하고, 땅은 하늘을 법칙 삼아야(의지해야) 하고,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아야(의지해야) 하고,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법칙으로 삼아야(의지해야) 어그러짐이 없다. 사람은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 땅의 식물들과 동물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 공기들을 흡입하며 산다. 그런데 그 하늘은 인간의 의지로 운행할 수 없고 스스로의 어떤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그 도(道)의 원리에는 인위(人爲)가 없고 ‘저절로 그러함(自然)’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면 그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다. 사람⊂땅⊂하늘⊂도=자연, 줄이면 인간⊃자연이 아니라, 인간⊂자연이 된다. 인간이 자연 지배를 정당화해서 함부로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정복하는 현대 사회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 겸허(謙虛)한 삶의 태도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것이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에게는 병이 없다.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안다. 그런 까닭에 병이 되지 않는다.
知不知上지부지상 不知知病부지지병 未唯病病 是以不病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知之爲知之지지위지지 不知爲不知부지위부지 是知也시지야)’이라고 하였는데 노자가 말한 ‘알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은 방식은 달라도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무지를 자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식 추구의 방향에서 공자나 노자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이상적인 사회 : 소국과민(小國寡民)
유가 사상가들이 추구하였던 대동사회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노자가 추구하였던 소국과민의 사회는 다음과 같다.
소국 과민이란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즉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무욕의 사회이다. 작다는 것은 옆에서 개가 짖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나라의 크기를 뜻한다. 이상적인 백성은 완전한 무지의 상태라고 본다. 백성이 완전히 무지하다면 그들은 악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이 굶주린다면 그 이유는 정치를 하는 지도층이 늑탈하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지도층이 어떤 일을 인위적으로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는 정치는, 공자가 말하는 예의와 법도에 근거한 덕치가 아니라 무위의 정치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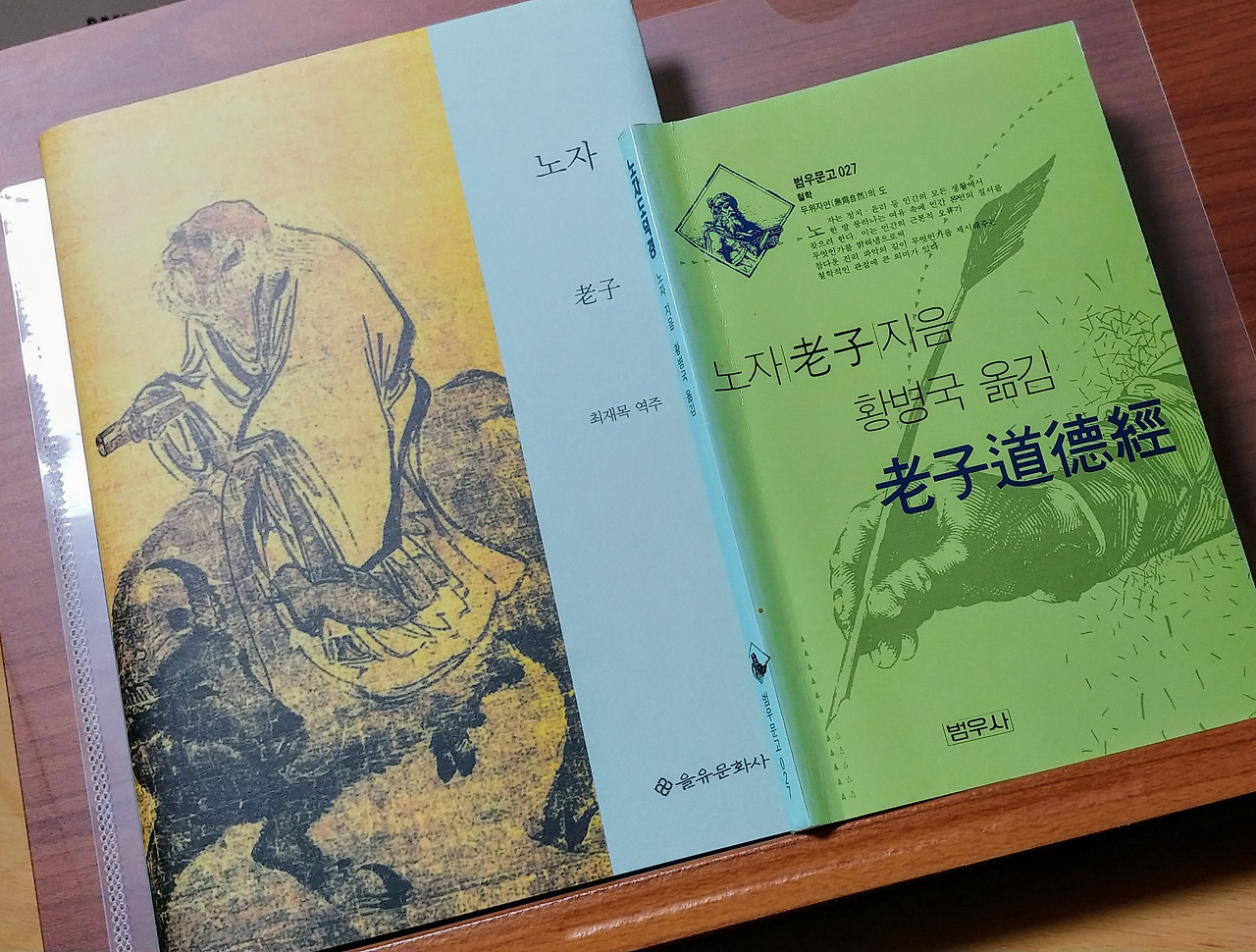
<참고한 책>
최재목 역주, '노자(을유문화사)'
황병국 옮김, '노자도덕경(범우사)'
이외의 책과 문서들
'인문고전독서 > 동양고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사상가 시리즈(5) 노자와 상선약수_1회 (0) | 2025.03.07 |
|---|---|
| 동양사상가 시리즈(4) 장주의 ‘장자’ (0) | 2025.03.07 |
| 동양 사상가 시리즈(2) 맹자의 '맹자' (0) | 2025.03.07 |
| 동양사상가 시리즈(1) 공자와 '논어' (1) | 2025.03.07 |
| 장자, '조릉의 장주' - 산목 편에서 (0) | 2025.03.07 |